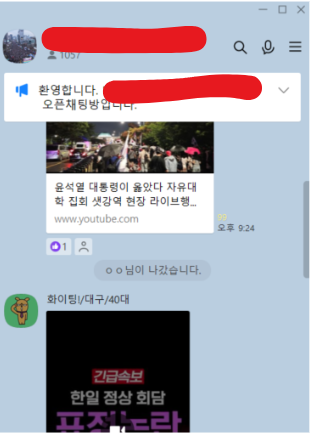채팅방에 들어선 순간, 익숙한 이모티콘 대신 비방과 조롱이 쏟아진다. “좌놈들”, “개돼지 국민”, “중국공산ㄷ 조져야”라는 말이 서슴없이 오간다. 이곳은 분노의 집결지다. 한때 촛불을 들었던 광장은 이제 손가락 몇 번으로 지옥과 음모의 방이 된다.
하지만 이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을까. 그 안엔 좌절한 30대 여성, 세금에 지친 60대 남성, 기회를 박탈당했다 느끼는 청년들이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말해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그 말 앞에서 기자인 나는 잠시 침묵했다.
문제는 ‘왜곡된 해석’이 ‘집단의 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클릭 한 번으로 전파되고, 유튜브는 분노를 먹고 자란다. 혐오 발언이 논리인 양 소비되고, 음모론이 신념이 되는 지금, 진실은 조용히 밀려난다.
우리는 지금 여론이 아니라 ‘확성기 경쟁’을 목격하고 있다. 더 많이 외치는 쪽이 이긴다. 더 자극적인 말이 중심이 된다. 침묵하는 다수는 점점 작아진다.
이제는 묻자.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디지털 광장이 ‘분노의 재생산기’가 아니라 ‘공론의 장’이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플랫폼의 책임이다. 혐오·허위정보에 대한 방치가 아닌 ‘공론장 규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언론의 감시와 검증이다. 클릭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시민의 회복력이다.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은 결국 교육과 경험에서 자란다.
디지털 광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곳을 더 좋은 말, 더 깊은 질문, 더 성숙한 용기로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외칠지보다, 어떻게 들을지를 고민할 때다.